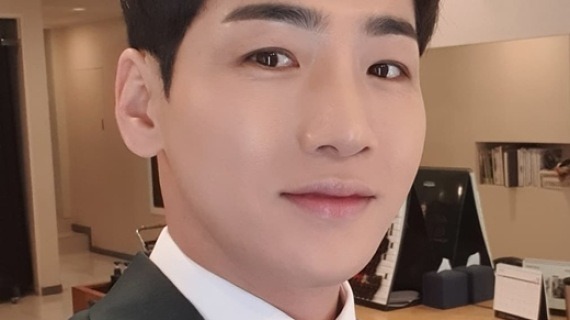강화되는 디지털 노동 감시, “모조리 촬영하면 사고 안 날까요?”
지난 2018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 씨가 숨진 이후 발전소에도 각종 안전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로 특히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CCTV말고도 이동형 블랙박스와 보디캠, 캠코더 등을 사들여 노동자들의 작업 모습을 일일이 촬영한다는 점입니다. 발전 5사 중에 안전관리 명목으로 기존 CCTV말고도 이동식 촬영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3사. 서부발전 387대, 중부발전 109대, 동서발전 13대 등이었는데, 장비 구입에만 최소 수천 만 원 이상 예산을 썼습니다.

발전소는 블랙박스 설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장비이며,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5년 차 발전소 재하청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위험해보이는) 시설물에 대한 보강에 돈을 좀 더 써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도록 보강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책임 소재를 피하려고 오히려 그런 거(촬영 장비)에만 더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태안화력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
작은 위험들이 쌓여 큰 사고가 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특고압 전동기 주변 흔들리는 안전펜스를 손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모든 발전소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블랙박스 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이 아닌지 반문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촬영을 거부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까지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촬영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하면 화력발전소 출입을 거부 당할 수 있다’고 버젓이 명시돼있습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B씨는 “노사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사측이 ‘안전캠’이라는 이름으로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보일러 주변 다량으로 누출되고 있는 재를 해결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시조치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감내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곳에는 회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중대재해 사업장 2곳 중 1곳, 과거에도 산재 발생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을 맞아 펴낸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59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건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죽음이 있었던 곳에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분명하다는 건, 사고 이후 이들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발전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수백억 원을 들여 근로 조건 개선 사업을 하고, 노동자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청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중대재해법이 생긴 이후에 노사 양측 모두 더욱 긴장감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달 쉰 명 남짓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상황,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죽음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선 겸허해집니다. 하루에 1.7명이 일하다 숨진다는 사실은 누군가 여전히 아래로 고인 위험을 뒤집어쓰고 일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